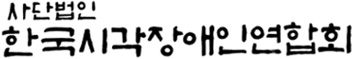한 해 전 꼭 이맘 때였습니다. 대전의 식장산 등산로에서 울긋불긋 등산복을 차려 입은 시각장애인들과 마주쳤습니다. 인근 장애인복지관의 시각장애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등산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저마다 한 손에는 스틱을, 다른 한 손으로는 앞서가는 자원봉사자의 배낭에 매단 끈을 잡고 숨을 고르며 산을 올랐습니다. 등반에 나선 시각장애인 6명 중에서 2명은 약시였고, 나머지 4명은 빛조차 구별할 수 없는 이른바 ‘전맹(全盲)’이었지만 어찌나 능숙하게 산을 오르던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붙였더니 모처럼의 등반에 들뜬 이들은 지리산이며 덕유산을 오르내렸던 무용담부터 시작해 그동안 섭렵했던 산 이름을 하나하나 꼽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별 뜻없이 던진 질문이 “왜 매번 다른 산에 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생각없는 질문’이었다고 여겨지지만, 그때는 그게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이 산’이나 ‘저 산’이나 무어 다를 게 있을까 싶었던 것이지요. 눈으로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위한 등산이라면 구태여 먼 곳의 다른 산을 찾아다니는 것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한 중년의 시각장애인이 씩 웃더니 답을 해줬습니다. 그는 산길을 걸으며 느끼는 감각에 대해 말했습니다. 발끝으로 느끼는 촉감과 코끝을 스치는 숲내음, 풀잎의 서걱거리는 소리와 얼굴에 닿는 기분좋은 햇볕과 바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해발고도가 높은 산의 정상에 섰을 때의 느낌이 얼마나 뿌듯한지에 대해서도 들려줬습니다. 그의 결론은 “눈이 보이지는 않지만 가본 산 중에서 똑같은 산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멋모르고 던졌던 질문이 부끄러웠습니다..
여행길에서, 또는 산에 오르면서 무엇을 보고 또 느끼시는지요. 산을 내려오면서 줄곧 든 생각은 우리가 얼마나 ‘단편적인 여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바닥의 감촉과 코끝에 스치는 향기, 내민 손으로 느끼는 촉각과 피부에 와닿는 공기 같은 것은 일상에서는 물론이고 여행길에서도 좀처럼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저 탐욕의 눈과 입으로 ‘보는 것’과 ‘먹는 것’만 좇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도록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물러가고 이제 막 청명한 가을이 당도했습니다. 기분좋은 가을 공기와 피부에 닿는 바람이 더없이 상쾌한 계절. 가을은 모름지기 모든 감각이 예민하게 깨어나는 때입니다. 여행의 노상(路上)이어도 좋겠고, 일상의 출퇴근 길이어도 관계없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온몸의 감각기관을 다 열고 온몸으로 맞이해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