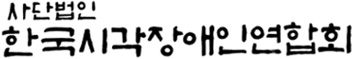포천 베어크리크서 시각장애인 골프대회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클럽으로 공을 때릴 때 오는 임팩트에서 짜릿한 감각을 느낍니다. 공이 홀에 들어갈 때 나는 '땡그랑'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절로 좋아지죠."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 골퍼 김진원(52) 씨는 골프의 매력을 이렇게 설명했다.
김 씨는 30일 경기도 포천의 베어크리크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5회 한국시각장애인 골프대회에서 네트 스코어 85로 우승을 차지했다.
네트 스코어는 총 타수에서 핸디캡을 뺀 것으로, 김 씨의 핸디캡은 전맹 부문 남자 선수에게 적용되는 기준 핸디캡(56)보다 낮은 48이다.
이에 따라 김 씨는 18홀에서 133타를 치고 우승한 셈이다.
이번 대회에는 홍콩과 일본의 초청 선수 3명을 포함해 전맹과 약시 부문에 26명이 출전해 기량을 겨뤘다.
고등학교 때 사고로 시력을 잃은 김 씨는 안마사로 일하고 있으며, 한국에 시각장애인 골프가 도입된 2000년대 후반부터 클럽을 잡았다.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골프에 대해 이야기하자 "용어라도 따라잡자"는 마음에 시작했다고 한다.
김 씨는 "실명하기 전에는 본 적도 없는 골프를 뒤늦게 시작했지만 매력에 푹 빠졌다"면서 "드넓은 골프장을 걸을 수 있고 골프가 몸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건강관리에도 최고"라고 '골프 예찬론'을 폈다.
2007년 제1회 아시아시각장애인 골프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수상 경력도 수차례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필드로 나갔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할 정도로 열정만큼은 '프로급'이다.
아예 앞을 볼 수 없거나 약시를 가진 선수들이 참가하는 시각장애 골프는 비장애인 경기와 다른 규칙이 몇 가지 있다.
특히 선수들이 자신이 정한 코치와 동행하면서 공의 위치에 대한 조언을 듣고 어떻게 칠지 결정하는 것은 시각장애 골프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서포터'로 불리는 코치는 클럽을 정해주거나 공에 클럽 헤드를 대줄 수도 있다.
김 씨는 "경기에서 선수의 실력만큼이나 서포터와의 신뢰와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지금의 서포터와는 지난해부터 호흡을 맞춰왔는데 '찰떡궁합'이다"라고 자랑했다.
이번 대회가 국제대회에 나설 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리면서 김 씨는 올가을 호주오픈대회에도 출전한다.
그는 "오늘 너무 못 쳤다고 생각해 포기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 기회를 잡았다"면서 "호주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시각장애인 골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7년 한국시각장애인골프협회(KBGA)가 출범하면서다.
그해 10월 제1회 한국시각장애인골프대회가 개최된 이후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지만 국내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롭게 골프를 즐기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다.
대회를 주최한 베어크리크 골프클럽의 조규섭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