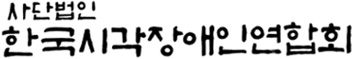지난 28일 오후 서울대 음대. 피아노 실기 수업을 마치고도 10분쯤 지나서야 시각장애인 김상헌씨(20·피아노과 2학년)가 나왔다. 조교가 앞이 보이지 않는 김씨의 손을 잡아 기자에게 안내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다. 몸이 건강한 학생도 학기 초엔 긴장과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컴퓨터로 해야 하는 수강신청부터 강의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수업을 듣는 것까지 그에겐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현재 서울대생 중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은 그가 유일하다.
“교재 구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신경쓰여요. 작년에 교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올해는 수강신청 하기 전에 듣고 싶은 수업마다 필요한 교재를 물어봐서 미리 준비했어요.”
2009년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학생들은 필요한 책을 해당 출판사를 통해 디지털 파일 형태로 구해볼 수 있다. 김군은 그렇게 구한 전자 교재를 점자단말기에 넣고 손끝으로 읽는다.
“일반 교과서는 그래도 구하기 쉬운 편인데, 악보는 제작 과정이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악보가 나올 때쯤이면 벌써 수업 진도가 다른 곡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악보 없이 그냥 남이 치는 걸 귀로 듣고 미리 외워 가는 수밖에 없죠.”
지난 겨울방학엔 큰 수술도 받았다. ‘퇴행성 변태’가 진행되는 양쪽 안구를 적출하고 신경과 혈관을 새로 심는 어려운 수술이었다. 몸은 괜찮으냐는 질문에 “체력적으로 좀 힘들지만, 연습하다가 힘들면 중간에 잠깐씩 누워 쉰다”고 담담하게 답했다.
김씨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서울 강북구 한빛맹학교에서 초·중·고 과정을 마쳤다. 예능교육은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집안은 넉넉지 않았다.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야 했던 어머니는 장애인인 그를 돌볼 시간도 없었다. 초등학교 내내 1년치 자모회비 3만원을 못낼 정도였다. 피아노에 소질이 있다는 것은 세살 때 알았지만 피아노 교습을 받은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그에게 피아노를 가르친 신현동 교수는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주며 제자를 격려했다. 자신의 존재가 남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던 그는 이후 피아노에 매달렸다. 201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음대 피아노과에 합격했다(경향신문 2010년 3월10일자 24면 보도).
하지만 대학생활도 입시 준비만큼이나 쉽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에 혼자 남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갈 데가 다 정해져 있는지 모두 바쁘게 나가버리더라고요. 한 번은 친구들에게 어디 가느냐 물어봤더니 놀러간다, 도서관에 간다 대답하더라고요. 수업 말고도 갈 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의 수업시간이면 근로장학생이 과목별로 따라 들어와 자리를 안내하고 필기 등을 도와준다. 하지만 근로장학생은 음대 학생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세한 수업 내용까지 챙겨줄 수는 없다. 관악구에서도 일주일에 세 번 도우미를 파견해 김씨가 강의실과 기숙사를 오갈 때 돕는다.
“가끔은 누가 도와준다는 것이 장벽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도우미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거든요. 난 친구도 사귀고 싶고 새로운 사람과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친구 사귀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는 그는 여느 대학생들처럼 ‘평범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묻자, 망설임 없이 동아리 MT를 이야기했다. MT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지난해 5월7일 제가 속해 있는 기독교 동아리 MT에 갔는데 재밌었어요. 학교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랑 게임 하고 놀고,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신났죠. 놀이공원이나 수영장에도 가보고 싶어요.”
졸업하면 유학을 다녀와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그의 소망이다. “국적과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감정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음악은 전 세계에 통하는 동일한 언어잖아요. 스스로 감정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의 폭을 넓혀주고 싶고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도 치유해주고 싶어요.”
인터뷰를 마친 김씨는 연습실로 향했다. 그는 붐비는 낮시간을 피해 매일 오후 8시부터 밤늦게까지 연습한다.
“아직까진 피아노가 지겨운 적이 없었어요. 피아노는 내겐 가장 소중한 친구니까요.”
출처 : 경향신문, 2011-03-29,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