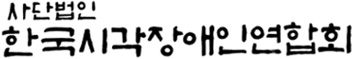어느 노병의 농담 / 이진규(시각장애 1급, 경기도 포천시)
어느 지식사전에는 우리네 인생을 비유하여 쓴 이런 글이 있다.
‘정상에 이르려는 불타는 야망으로 서로를 짓밟고 기둥 위로 오르는 무수한 애벌레들이 있다. 그들은 정상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다만 거기에 그들이 갈구하는 바로 그것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서로 밟고 밟히는 치열한 경쟁을 하며 위로 오른다. 그러나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정상에 오른 애벌레들의 대화를 들어보자.
"여기 정상엔 아무것도 없잖아!"
"이 바보야, 조용해. 저 밑에서 듣잖아. 우린 저들이 올라오고 싶어 하는 곳에 와 있는 거라고. 중요한 건 그거란 말이야."
그들은 애써 절망과 허무함을 달래며 정상에 머물러 있다가 밑에서 차고 올라오는 다른 애벌레들의 기세에 밀려 까마득한 기둥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만다. 이 지식사전에서 말하려는 것은 결국 인생의 종말은 허무하다는 얘기다. 그렇다. 사람이 산다는 게 별거면 얼마나 별거겠는가. 어차피 태어나면서 태워진 인생열차에 실려 가다 누군가 내리라면 내리고 더 가라면 조금 더 가다 내릴 뿐이다.
사람들은 비장애인 노인에 비하여 시각장애 노인들의 일상이 대체로 단조롭고 외로울 거라 단정할지 모르나, 내 생각은 크게 다르다. 눈이 보이면 보이는 대로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제가 만든 마음의 연못에 열대어한 마리쯤 키우면서 그것을 즐길 줄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지수에 무슨 차등이 있겠는가?
요즘 내 일상을 누가 알면 참으로 단조로워서 연민의 정을 느낄지 모르나 오늘을 살고 있는 내 일상에 나는 조금도 불만이 없다. 하루에 한 번쯤 산책로를 오르다가 또 찾아온 가을과 몇 호흡쯤 악수하고 돌아와서는 이런저런 잡지사에 보낼 원고지에 칸 메우기 좀 하다가 때로는 어제 마시다 남은 술병을 열어 한 잔 마시고 오늘을 내일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 작업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컴퓨터로 내려 받아 놓은 책이나 음성도서관에 연결하여 책을 듣는 일이다.
일단 스피커에서 읽기가 시작되면 나는 볼륨을 제일 작게 낮추고 책의 내용에 대충 집중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 내 수면시간은 그 편차가 크다. 내 호기심을 자극하여 날밤을 새우는 일도 더러 있지만, 대체로 30분 만에 꿈나라로 가기 일쑤다. 결국 내 독서 버릇은 잠들기 위한 수면제로 쓰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읽는 책이라야 별거 아니다. 교양서나 자기계발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생존경쟁의 전선을 떠난 노병인 이 나이에 윤리 선생님의 말씀 같은 책 몇 권 더 읽는다고 스마트한 인간으로 개조될 가능성도 없으려니와, 이제 와서 굳이 그런 인간으로 개조될 생각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의 내 독서 습관은 매우 편향적이라 말할 수 있다. 추리물이나 공포, 무협판타지, 따위에 빠져 긴박감, 박진감 넘치는 서스펜스나 스릴러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누가 말리랴. 사람들은 소설 한 편을 읽고도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현란한 서평을 하더라만 그조차도 좀 우스워 보이는 건 내 감정이 메마른 탓일까. 뚝 잘라 말하지만 소설은 그냥 이야기꾼들의 입담 정도로 여길 뿐, 도대체 소설에서까지 어떤 심각함에 빠지기는 싫은 거다.
시드니 셀던의 긴박함에 빠지거나 존 그리샴, 셜록 홈즈의 추리물을 읽다가 하루가 한 시간으로 당겨지는 마법에 빠진대도 나는 나를 나무라고 싶지 않다. 소설을 읽다가 중요한 약속을 깜빡한들 친구와의 만남보다 즐거운 시간여행을 하고 있었다면 나로선 전혀 손해나는 장사가 아닌 거다.
누가 말했던가? 노병의 계절은 가을이라고. 그래도 좋다, 나는 가을 길을 걷는 노병이다. 그러므로 이쯤에서 이 인생의 노병은 저 만추의 낙엽만큼 외로워지기 전에 농담 한 마디를 던지며 다만 사라지려 한다.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